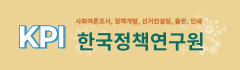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특별사면 직후 첫 일성으로 “과거 청산”을 이야기했다. 그가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 한국 정치사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다. 일제 잔재 청산이나 군사독재 잔재의 극복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였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등 전직 대통령들 역시 시대적 사명으로 청산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조국의 발언이 던지는 울림은 달랐다. 국민 다수는 그의 입에서 먼저 ‘겸허한 자숙’과 ‘솔직한 반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는 장관 재임 시절부터 퇴임 이후까지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족 관련 의혹과 재판,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한국 사회를 심각하게 양분시켰다. 물론 사법적 판단은 종결되었고, 사면이라는 정치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과거는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채 남겨진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렇다면 조국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태도는 정치적 투사로서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의 성찰과 겸허함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출범 당시 군사정권 청산을 외치면서도, 정치적 반대파와의 협치를 통한 제도적 개혁에 힘을 기울였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군부독재에 맞섰던 민주화 투사였지만, 집권 이후에는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적 통합을 우선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위해 야당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했고, 심지어 선거법 개정을 위해 한나라당에 ‘모든 것을 내주겠다’는 과감한 언사를 사용할 정도였다. 이들 지도자의 언어는 청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한 비전과 자기 희생으로 이어졌다.
반면 조국의 첫 언어는 여전히 ‘과거의 청산’에 갇혀 있었다. 이는 국민 다수에게 자기 반성과 책임 회피 부족으로 읽힌다. 정치 지도자가 되려는 인물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한다. 청산의 언어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화해의 언어였고, 분노의 정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통합의 리더십이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는 과거의 반복이 아니다.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국제정세 속의 안보와 외교적 도전이야말로 미래의 의제다.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과거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가”가 아니라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답해야 한다. 미래를 말하지 못하는 정치인은 결국 과거의 상처를 재소환하며 포퓰리즘에 의존할 뿐이다. 국민은 더 이상 분열을 재생산하는 정치가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조국이 다시 정치 무대에 설 뜻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의 과정을 먼저 밟아야 한다. 스스로의 오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자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정치적 복권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반성과 자숙 없는 청산은 공허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회를 또다시 갈등과 대립의 늪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
과거 청산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반성 없는 정치인의 무기가 아니라, 국민 통합을 위한 도구가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조국의 언어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의 정치적 가능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민은 ‘과거의 청산가’가 아니라 ‘미래의 설계자’를 원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가 자기 희생과 통합을 담아낼 때만이, 진정한 미래의 길이 열릴 것이다.